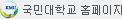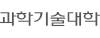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水素경제를 주목하는 이유 / 유지수 총장 | |||||||
|---|---|---|---|---|---|---|---|
한국경제 돌파구 유망 일자리 창출 유지수 < 국민대 총장 jisoo@kookmin.ac.kr >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이 안 보인다고 한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졸자는 한 해 66만명이나 쏟아져 나오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소위 ‘선망 일자리’는 5만개밖에 안 된다. 현재까지 선망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의 주축은 제조업이었다. 문제는 대형 제조기업이 고임금 덫에 걸려 국내 생산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시설투자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제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제조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다. 또 제조업과 같은 대량 고용창출을 서비스업에서 기대하기는 무리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선망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돼야 한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1980년대 우리는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득을 봤다. 정부가 기술변환시기에 세계를 앞질러 통신 인프라에 투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는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시설투자를 하고, 투자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한국형 선순환구조가 성공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금도 이런 돌파구가 없으면 창조경제는 결실 없는 텅 빈 슬로건으로 남게 될 뿐이다.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다. 현 시점에서의 돌파구는 ‘수소경제’를 꼽을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기술 변환과 같이 에너지에도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셰일혁명으로 값이 싸진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유럽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비록 자원은 없지만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가스인 ‘부생가스’를 활용해 수소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에너지변혁의 시기에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도 발전용 연료전지 부문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3년에 이미 발전용 연료전지를 이용해 109㎿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는 330㎿까지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송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미미하다. 수송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는 기존의 전기차와는 다르다. FCEV는 기존의 전기차처럼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사용해 ‘스택(stack)’이라고 하는 자체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가장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다. 더욱이 FCEV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우선 수소를 만드는 시설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한국도 석유화학산업과 제철산업이 크기 때문에 부생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수소생산설비를 건설하면 석유화학산업과 제철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충전인프라 건설은 침체된 건설산업을 살리는 방안도 된다.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인프라가 구축돼야 고객이 FCEV를 사게 된다. FCEV 판매 전망이 밝아지면 자동차 기업은 기술투자를 더 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핵심기술은 소재기술이므로 자연히 소재기업과 협업해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기공급기, 압력조절기, 이온제거기 등이 개발돼야 하는데 이는 부품업체 몫이다. 부품업체 또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유지수 < 국민대 총장 jisoo@kookmin.ac.kr >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 |
|||||||
| 이전글 | [Weekly BIZ] 假說 없이 관찰하고 경험하라 / 주재우(경영학부) 교수 |
|---|---|
| 다음글 | [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北-中 관계 악화와 북한 엘리트의 활로 / 안드레이 란코프(교양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