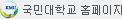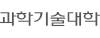|
1907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분쟁’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같은 영토분쟁이 고려 때도 있었다. 1014년(현종5) 거란이 압록강 동쪽 고려 영토인 보주(保州·지금 義州)성을 점령한 뒤 고려가 이곳을 되찾은 건 100여 년 뒤인 1117년(예종12)이다. 거란이 보주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점만 다를 뿐 장기간에 걸친 영토분쟁이란 점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과 다를 바 없다. 분쟁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거란이 압록강에 다리를 놓은 뒤 그것을 끼고 동서로 성을 쌓았다. 고려는 군사를 보내 공격해 깨뜨리고자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려사』권4 현종6(1015) 1월)
거란이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설치해 고려 영내로 들어와 성을 쌓은 건 1014년(현종5) 6월이다. 6개월 뒤인 1015년 1월 고려가 이 성을 공격한 것이다. 거란 측 기록에 따르면 이때 거란이 쌓은 성은 압록강 서쪽의 정원성(定遠城)과 동쪽의 내원성(來遠城)이다.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내원성을 공격했다. 거란은 고려 영토인 보주를 점령해 내원성으로 이름을 고쳐 거란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고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영토침략 행위였다.
거란이 1010년(현종1) 두 번째로 침략하자, 고려는 국왕 현종이 거란에 직접 가서 항복하겠다는 조건으로 화의를 맺는다. 그러나 현종이 거란에 가지 않자, 거란은 이를 빌미로 강동 6성의 반환을 요구한다. 이마저 고려가 거부하자, 1014년 6월 거란은 보주성을 점령한 것이다.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오가는 육로의 요충지인 보주 점령은 강동 6성을 되돌려 받기 위해 군사적으로 고려를 압박하려는 거란의 선제 공세였다. 전략과 교통의 요지인 강동 6성의 지정학적 가치를 거란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방증이다.

거란 침입 대비해 압록강변 천리장성 축조
보주성 점령 4개월 만인 1014년 10월 거란은 제 3차 침략을 단행한다. 3개월 뒤 고려는 앞의 기록과 같이 기습적으로 보주성을 공격하다 실패한다. 3차 전쟁은 5년 뒤인 1019년 2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을 물리치면서 종결된다. 그러나 고려는 보주성을 반환받지 못했다. 10년 뒤 고려는 다시 보주성을 공격한다.
“1029년(현종20) 흥요국(興遼國)이 요(거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거란이 고려에 구원을 요청했다. 문신 곽원(郭元)은 왕(현종)에게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점령한 성을 이번 기회에 공격해 빼앗기로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사위(崔士威)·서눌(徐訥)·김맹(金猛) 등은 상소를 올려 불가능하다고 건의했다. 곽원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군사를 동원해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그 때문에 등창이 나서 죽었다.”(『고려사』권94 곽원 열전).
1029년(현종20) 발해 후손 대연림(大延琳)이 거란에 반란을 일으켜 흥요국을 세우자, 거란이 고려에 흥요국 진압을 위한 구원병을 요청했다는 기록이다. 이때 보주성 공격을 제안한 곽원은 거란이 1014년(현종5) 6월 제3차 침략을 단행했을 때 사신으로 송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거란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매파였던 것이다. 곽원은 다른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한다. 고려는 1015년(현종6) 1월에 이어 14년 만에 단행한 두 번째 보주성 탈환 전투에서도 패배한 것이다.
2년 뒤인 1031년 현종이 숨지면서 그의 맏이인 덕종(德宗·1016~1034년, 1031~1034년 재위)이 즉위한다. 그해 10월 고려는 고려 침략을 주도한 거란 국왕 성종(聖宗)의 장례식(이해 6월 사망)과 흥종(興宗)의 즉위식에 사신을 파견할 때 보주성 반환을 요구한다. 고려가 이같이 거란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건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다.
먼저, 흥요국 건국과 같은 발해 부흥운동 직후 거란 성종이 숨지고, 부마 필제(匹梯)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 거란의 어수선하고 불안한 정세가 작용했다. 고려는 이를 틈타 보주성을 반환받으려 했던 것이다. 다음, 당시 고려는 덕종의 장인 왕가도(王可道)가 정국을 주도했다. 왕가도는 거란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매파였다. 매파와 비둘기파를 적절하게 이용해 정국을 주도하던 현종이 죽자, 매파인 왕가도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이해(1031년) 11월 거란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한 고려 사신이 귀국한다.
“(사신) 김행공(金行恭)이 귀국하여 ‘거란이 우리 고려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보고했다. 평장사 서눌(徐訥) 등 29명은 ‘사신 파견을 중단하자’고 했다. 반면 중추사 황보유의(皇甫兪義) 등 33인은 ‘거란과의 단교는 결국 (전쟁을 일으켜)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폐단을 가져다 줄 것이니, 거란과의 관계를 유지해 백성을 쉬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덕종은 서눌과 왕가도의 의견에 따라 사신 파견을 중단하고 죽은 거란 성종 연호만 사용하기로 했다.”(『고려사절요』 권3 덕종 즉위년(1031) 11월)
거란이 보주성 반환을 거부하자 고려는 새로 즉위한 흥종의 연호 사용을 거부한 것이다. 거란의 새 국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려는 이듬해인 1032년(덕종1) 정월 거란 사신의 입국도 거부한다. 거란과 외교관계까지 단절한 것이다. 고려는 이어 삭주(보주 인근), 영인진(함경도 영흥), 파천현(함경도 안변) 등지에 성곽을 쌓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다. 이 조치의 연장이 1033년(덕종2) 시작된 압록강 하구에서 함경도 안변 도련포까지의 천리장성 축조다(1044년 완성).

덕종, 강경파 장인 사망 넉 달 뒤 같은 운명
덕종이 즉위 4년 만에 숨지자 상황은 급변한다. 전왕의 동생 정종(靖宗고려 제10대 국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1035년 거란은 외교관계의 재개를 요구한다. 여러 차례 교섭 끝에 1039년(정종4) 두 나라는 보주 문제에 타협하고, 8년간 중단된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선왕(성종)의 유지(遺志)를 거스를 수 없다는 구실로 거란은 보주성 반환을 여전히 거부했다. 대신 이곳에 고려인의 농경과 정착을 허용한다. 보주성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고려가 농민의 경작과 정착권을 획득한 건 거란의 보주성 영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언제든 반환의 불씨를 살릴 근거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어떻든 보주성 영유권 문제는 긴 시간을 요하는 장기 과제로 남긴 셈이 되었다. 보주성 문제가 8년 만에 타협론으로 급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거란은 탐욕스럽고 사나워 신의를 지킬 수 없어 태조(왕건)가 그들을 깊이 경계하였다. 그러나 대연림(大延琳)의 난(발해의 후신인 興遼國을 건설한 일)을 계기로 거란과의 구호(舊好)를 버리는 것 또한 좋은 계책은 아니다. 현종은 어려운 때에 반정(反正)하매 미처 겨를이 없었다. 덕종은 어리기 때문에 더욱 전쟁을 경계해야 했다. 왕가도가 (거란과) 화친의 의리를 끊자는 주장은 화친을 유지하면서 백성을 쉬게 하자는 황보유의의 주장보다 좋지 않다. 정종이 왕위를 계승한 지 3년 만에 최연하(崔延嘏)가 거란에 사신으로 가고, 4년에 거란 사신 마보업(馬保業)이 왔다. 이때부터 (고려와 거란은) 다시 화평을 유지했다.”(『고려사』 권5 정종 12년, 이제현의 정종에 대한 史評)
이제현(1287~1367년)은 정종 때의 타협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나라와 고려의 원만한 관계를 희구한 원 간섭기 지식인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평가다. 그런데 위의 글을 읽어보면, 타협론이 나오기까지 매파를 대표한 왕가도의 단교론(斷交論)과 황보유의의 화친론(和親論)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종은 거란에 보낸 문서에서 ‘보주성 반환 주장은 전왕(덕종)이 제기한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거란과 타협한다. 즉 보주성 문제와 거란 관계의 재개는 별개라는 논리다. 정종의 즉위와 타협론의 득세 뒤에는 고려 정국 내부에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뒤따랐던 것이 분명하다.
이승휴(1224~1300년)는 『제왕운기』에서 “덕종은 어찌해서 (재위기간이) 4년에 그쳤는가? 봉황이 와서 태평성세를 송축하네”라고 당시 역사를 시로 읊었다. 『고려사』 등에는 나오지 않은 기록이다. 덕종 때 강경론을 주도한 정치세력의 몰락이 덕종의 죽음을 재촉했고, 이후 정국이 안정을 되찾은 사실을 암시한 것이다. 덕종의 장인으로 정국을 주도한 왕가도가 1034년(덕종3) 5월 사망하고, 덕종도 이해 9월 숨진 사실이 그를 뒷받침한다. 이보다 90여 년 전인 949년(定宗4) 1월 후견인 왕식렴이 죽자, 서경 천도를 추진한 정종(定宗고려 제3대 국왕)도 3개월 뒤 사망한 사실을 연상케 한다. 덕종은 천수를 누리지 못한 것이 분명하며, 그의 죽음은 보주성 문제를 둘러싼 강온론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결과였다. 즉 타협론이 등장하기까지 엄청난 정치적 희생과 대가가 뒤따랐던 것이 분명하다. 이승휴의 언급 외에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게 유감이다. 온건론(타협론)이 정국을 주도함에 따라, 보주성 문제는 이후 80년의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외교전을 통해 해결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원문보기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0964
출처 : 중앙선데이 기사보도 201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