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 [논쟁] 서울역 고가 공원화 계획은 바람직한가 ? / 이경훈(건축학부) 교수 | |||
|---|---|---|---|
|
고가 공원, 보행 친화 아니다
그렇다면 논의는 고가 공원이 과연 보행 친화적 정책인가로 좁혀질 수 있다. 지난 세기, 새로운 기술로 고무된 세계는 너나없이 고가도로·공중가로·육교나 지하도 같은 입체 시설을 지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서울은 세운상가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의 구상은 번잡한 거리를 피해 공중에 나무를 심은 가로를 만들어 종묘에서 남산까지 보행로뿐 아니라 녹지까지 연결한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다. 유토피아를 꿈꾼 야심 찬 공중보도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되다 우범지대로 변해 폐쇄됐다. 건물 사이를 잇는 육교는 철거됐는데도 거리는 거리대로 늘 그늘져 음산하다. 도시에서의 걷기에 대해 오해한 탓이다. 10년 전 버스 중앙차로 등 서울의 대중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데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영향이 컸다. 지하철 건설을 포기하고 버스와 걷기,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삼은 이름난 생태도시다. 이 도시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은 쿠리치바의 철학이 ‘사람의 이동은 평면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단언한다. 즉 보행 친화적 도시가 되려면 입체적 시설이 아니라 거리와 같은 높이에서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육교를 놔두고 무단 횡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위아래로 번거롭게 오르내려야 하는 입체적 이동이 인간 행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에선 녹지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걷지 않는다. 도시에서의 걷기는 마음먹고 대자연을 찾아가 즐기는 고요한 산책이나 등산과는 다르다. 생활의 공간인 거리의 상점 쇼윈도와 골목길의 번잡함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걷게 한다. 나무와 화초로 가꿔 놓은 ‘걷고 싶은 거리’가 한산한 반면 삼청동이나 경리단길·가로수길 같은 도시적 장소에 걷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이유다. 이처럼 세운상가의 실패는 ‘입체’와 ‘녹지’에 대한 환상이 결합된 ‘입체녹지’ ‘공중녹지’의 실패였으며 보행자 전용의 입체시설이 보행 친화적이지 않다는 교훈이었다. 서울역 고가 공원 또한 같은 오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은 어떤가. 하이라인은 기존의 고가철도와 건물이 근접해 별도의 시설을 만들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했다.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새로 나무를 심기보다 철길 위에 자라던 잡초를 보존하고 보행데크를 얹는 정도로 건축·조경의 개입을 최소화한 경우다. 그 결과 주변과 소통하는 도회적 산책로가 될 수 있었다. 허공을 가르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흙을 돋우고 나무를 심는 것과는 다르다. 박 시장의 말처럼 고가도로의 철거는 입체도시에 매혹됐던 지난 세기 도시정책의 폐기이자 사람 중심의 21세기적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부합하는 걷는 도시, 보행 중심이라는 큰 틀의 이해 안에서 도시구조 재편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거기에는 예정대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
원문보기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08477&cloc=olink%7Carticle%7Cdefault |
| 이전글 | 홀로렌즈로 본 세상... “자연스럽고 생생하다”/ 이민석(컴퓨터공학부) 교수 |
|---|---|
| 다음글 | [충무로에서] CEO 역할에 주목해야 할 이유, 디즈니의 부활 / 이은형(경영학부)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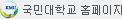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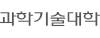



 “시민들이 아현고가도로의 마지막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서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과거 자동차 중심의 첫 상징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난해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현고가 철거 직전 걷기 행사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의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고가도로 철거는 여러 시장을 거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돼온 서울시의 정책방향이었다. 고가도로가 사람이 걷는 거리에 그늘을 만들고 시야를 가려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차량 소통에도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보행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와 부합한다. 고가가 철거된 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없었고, 청계천이 산뜻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 좋은 예다. 21세기 들어 17개의 고가도로가 철거됐고 서울역 고가도로도 지난해에 철거될 예정이었다.
“시민들이 아현고가도로의 마지막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서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과거 자동차 중심의 첫 상징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난해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현고가 철거 직전 걷기 행사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의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고가도로 철거는 여러 시장을 거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돼온 서울시의 정책방향이었다. 고가도로가 사람이 걷는 거리에 그늘을 만들고 시야를 가려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차량 소통에도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보행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와 부합한다. 고가가 철거된 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없었고, 청계천이 산뜻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 좋은 예다. 21세기 들어 17개의 고가도로가 철거됐고 서울역 고가도로도 지난해에 철거될 예정이었다.